이승엽 전 두산 감독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팩트 | 김대호 전문기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두산 베어스를 망치고 있다. 지난 2일 이승엽 전 감독이 중도 하차한 데는 오너인 박정원 회장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승엽 전 감독을 두산 사령탑으로 픽한 장본인이 박 회장이다. 얄팍한 야구 지식과 개인적 친분으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팀 컬러와 맞지도 않는 이 전 감독을 데려와 팀도 망가뜨리고 이 전 감독에겐 큰 생채기를 입혔다. 어느 팀보다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해 온 두산 프런트는 오너의 독선에 냉가슴만 앓았다. 단언컨대 당시 이승엽 감독 영입에 찬성한 구단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구단이 감독을 선임할 때는 복수 후보를 면접을 통해 2~3명으로 추린 뒤 구단주에게 보고하고 구단주가 결정한다. 류선규 전 SSG 랜더스 단장은 그의 저서 ‘야구X수학’에 "야구단 대표이사 또는 단장이 감독 후보자를 면접하는데 동일한 항목의 질문을 통해 감독 후보자와 구단의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라고 썼다.

두산은 지금 난파 직전이다. 팀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고 표류 중이다. ‘윈나우’를 노렸지만 허황된 목표로 판가름 났고, 세대교체엔 실패했다. 흑역사의 시작 지점에 서 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박정원 회장에게 있다. 2022시즌 9위로 추락한 두산은 시즌 뒤 양의지를 4+2년 총액 152억 원에 FA 영입했다. 박정원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듬해엔 FA 양석환을 4+2년 78억 원에 붙잡았다. 2021년 김재환의 4년 115억 원까지 3명의 FA에게 345억 원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2022시즌 뒤 이승엽 전 감독을 앉혔다. 당장 우승하라는 주문이다.
박정원 회장이 팀에 대해 조금만 더 파악했거나, 구단 내부의 조언을 구했다면 이승엽 전 감독을 영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산은 전통적으로 호쾌하고 빠르고 끈끈한 야구를 해왔다. ‘허슬두’라는 별칭처럼 투지와 근성을 앞세우는 팀이다. 그룹 이미지에 걸맞게 그런 팀 컬러를 만든 사람은 박정원 회장의 선친인 박용곤 전 회장이다.
2023년의 두산은 30대 중후반의 베테랑을 중심으로 당장 우승을 해야하는 팀, 여기에 개성 강한 선수들이 뭉쳐 있는 팀이었다. 순혈주의가 어느 팀 보다 강한 두산이다. 감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웬만한 경험과 카리스마로는 이런 선수들을 휘어잡고 나가기 어렵다. 지도자 경험이 전무하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이승엽 전 감독이 두산에 온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이다.

한국 프로야구에 ‘프런트 야구’는 없다는 말이 있다. ‘오너 야구’가 있을 뿐이란 뜻이다. 야구단 내에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어김없이 오너(구단주)가 개입돼 있다. 2022시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김원형 감독을 2023년 갑자기 경질한 SSG가 그렇고, 조금 더 과거로 가면 2014시즌 뒤 김성근 감독을 영입해 팀을 구렁텅이로 빠트린 한화가 그렇다. 프런트가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이 오너의 독단으로 한 순간에 무너진다.
LG 트윈스 역시 오너의 간섭이 심했던 구단이다. 사장과 감독이 가장 많이 바뀐 구단이 LG다. 프런트에 전문가가 없고, 감독은 오너 눈치만 봤다. 이런 LG가 구광모 회장으로 구단주가 바뀐 뒤 2023시즌 2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우연이 아니다. 구광모 회장은 전임 구단주와 달리 한 발짝 뒤에서 야구단을 응원했다. 그 틈에 야구 전문가가 프런트를 이끌면서 ‘명문구단’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한국 대중문화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너의 야구에 대한 열정을 탓할 순 없다. 다만 빗나간 애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 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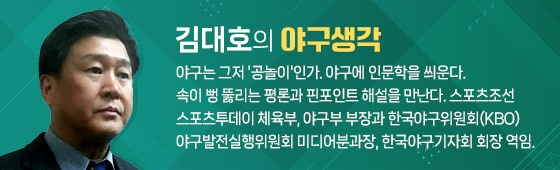
daeho9022@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