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 목표 지우고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더팩트 | 김대호 전문기자] 프로야구 감독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 정답은 ‘스프링캠프를 떠날 때'다. 모든 선수들이 뚜렷한 목표와 함께 스파이크 끈을 조여 맨다. 부상 선수도 없다. 오랜만에 승부에서 해방된 감독은 마음껏 1년 청사진을 그려 본다.
10개 구단 모든 감독이 ‘우승’을 꿈꾼다. 설령 최약체로 점찍힌 팀의 감독일지라도 이때만은 장밋빛 희망을 품는다. 김성근 전 감독은 예전 "스프링캠프 때 시즌 승수를 예상해 보니까 100승 넘게 나오더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다른 감독도 ‘이번 시즌은 해볼 만하다’고 전의를 불태운다.

이 설렘은 딱 지금, 2월 하순까지다. 프로야구 각 팀이 1차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2차 캠프지로 모여들고 있다. 1차 캠프는 체력과 기초훈련, 그리고 팀 전술훈련에 주력한다. 1차 캠프를 마치고 팀마다 10~20여 명의 선수를 추려낸 뒤 2차 캠프로 이동한다. 2차 캠프는 그야말로 실전이다. 일본 오키나와에 6팀(KIA 삼성 LG kt SSG 한화), 미야자키에 2팀(두산 롯데), 대만 가오슝에 2팀(NC 키움)이 캠프를 차렸다. 이곳에서 각 팀은 3월 초까지 8~10차례의 연습경기를 갖는다.
감독들에게 ‘현타’(현실을 자각하는 시간)가 오는 시점이다. 훈련 땐 불같은 강속구를 거침없이 뿌리던 신인 투수가 갑자기 '동네북'이 되고, 멀쩡하던 주전 타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나뒹군다. 감독의 구상에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여기에 연습경기에서 판판이 지면 그야말로 감독 머리는 쥐가 난다.
감독은 급하게 플랜 B를 짠다. 감독 수첩에서 선수 이름 위로 빨간 줄이 그어진다. 백업 선수들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여기에서 감독의 역량이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프로야구 감독은 시즌 전 두 가지 가정을 하고 계획을 짠다. 최상의 가정, 그리고 최악의 가정. 스프링캠프를 거치면서 양 극단을 지워가며 중간 지점을 찾아간다. 뛰어난 감독은 불의의 변수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미 제2, 제3의 대안을 준비해 놨기 때문이다. 이런 감독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조건, 즉 검증되지 않은 선수는 처음부터 전력에서 빼놓는다. 신인 선수, 외국인 선수, 부상 복귀 선수 등은 일단 전력 외로 제쳐놓는다.
가장 오판을 많이 하는 게 지난해 성적이다. 특히 우승팀을 비롯한 상위권 팀 감독은 지난해 성적을 기준으로 자체 전력 분석을 한다. 하지만 지난해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주전급들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덕분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을 것으로 기대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다.
현명한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단적인 예로 이범호 KIA 감독이 김도영의 올시즌 성적을 30홈런 40도루 100타점 이상으로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물론 김도영이 그 이상의 기록을 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믿고 전력을 짠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선수들의 실력을 객관화한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김성근 전 감독은 현역 시절 "시즌 들어가기 직전 다시 예상 승수를 계산하면 실제 성적과 5~7승 차이로 근접한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귀국하는 감독들의 얼굴은 떠날 때와 다르다. 노련한 기자는 공항 입국장에서 감독의 표정만 보고도 그 시즌의 성적을 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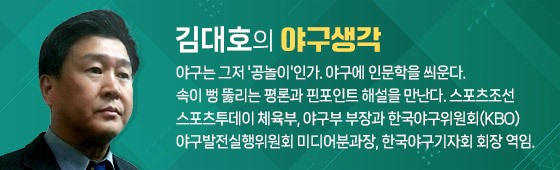
daeho9022@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