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박종권 언론인]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죽고, 열사는 이름을 얻기 위해 죽고,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그 권세 때문에 죽는다. 서민은 그저 그날그날의 삶에 매달릴 뿐이다."
사마천이 '사기'에서 소개한 한 문제(漢 文帝)시절 정치가 가의(賈誼)의 말이다. 맞는 말이다. 재물을 탐하다 신세를 망친 사람이 어디 하나 둘인가. 끝없는 권력욕에 결국 자신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례는 바로 눈 앞에도 있다. 탄핵 파면된 대통령 말이다.
서민은 일상의 가계에 매달려 열심히 일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한다. 그렇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바야흐로 초여름 대선이 눈 앞이다. 겨우 2주 남았다. 어쩌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싱거운(!) 경쟁으로 비친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인 50%를 넘을 것인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선을 지킬 수 있을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
나아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격차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득표율의 순서 뒤바뀜에 더 흥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판세가 기울자 선거의 열기도 뜨뜻미지근하다. 지난 18일 열린 첫 대선후보 토론회도 그랬다. 주제에 대한 치열한 공방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강조하는 흐름이었다.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이라고 전제했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 실제 자신이 당선되리라 기대한 후보가 있었을까. 모를 일이다. 선거가 지닌 마성은 4명 중 4등을 한 후보도 자신이 유리하게 손가락 셈을 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의 썩은 줄일 망정 붙들고 매달린다고 하니까.
실제는 대선 이후에 벌어질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잡거나 유명무실해진 정당세력의 존재감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강해 보였다. 지나친 평가일까. 대선후보 토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말꼬리’였다. 발언의 진의나 함의에는 눈을 감고 일부분만 뚝 떼어내 이를 전체적 사실로 전제하고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실을 호도(糊塗)하려는 대표적 수법이다. 청중을 기만해 상대에게는 무능과 거짓의 이미지를 씌우고, 자신은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덧칠하는 거다. 이런 말꼬리 잡는 수법을 비교적 토론문화에 익숙하고 논리 정연하다는 후보가 구사하는 대목에서 선거가 가진 맹목성의 일부를 느꼈다면 지나칠까.
"말꼬리를 잡는다"는 말은 원래 '사기'의 ‘백이열전’ 마지막에 나온다. 지조를 지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 먹다 굶어 죽은 백이(伯夷) 이야기이다. 그가 비록 훌륭하지만 공자(孔子)가 칭찬하고서 그 명성에 더욱 드러났다는 거다. 공자의 제자 안연(顔淵)도 공자의 칭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됐다면서 이를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간다"고 비유한 거다.
이처럼 때를 가늠해 나아가고 물러나는 훌륭한 선비라도 그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덕행과 지위가 높은 선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예컨대 고 건 전 총리의 경우도 그 자신이 훌륭하지만 이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높이 사면서 ‘행정의 달인’이란 칭호를 얻었다는 것 쯤일까.
하지만 요즘으로 보면 말꼬리에 붙은 파리는 백이나 안연 같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이들을 폄하해 지칭하는 듯하다. 예컨대 박정희 집권 때 육사 출신들이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요직에 등용되는 경우 말이다. 비록 향기로운 이름보다 이런저런 악명과 오명을 얻었지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시절 ‘육법당’도 그렇고. 민주화 세력이지만 동교동계나 상도동계처럼 한편으론 대의를 위해 또 한편으론 입신양명을 위해 DJ와 YS를 중심으로 몰려든 정객들도 천리마의 꼬리에 붙은 파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까이 보면 ‘친노’나 ‘친문’, ‘친이’와 ‘친박’도 그럴 것이다. 물론 ‘친윤’과 ‘찐윤’도 그렇고 말이다. 물론 이들 그룹 밖에서 ‘반(反)’과 ‘비(非)’를 붙인 아웃사이더 그룹도 기실 주류 그룹에 들지 못한 반작용이겠다. 아마도 앞으로 새로운 ‘친이’와 ‘찐이’와 ‘반이’도 생기겠지만. 최근 맥 빠진 선거운동에 요란한 날갯짓 소리가 들린다. 바로 ‘플라이’들이다.
영어로 플라이(Fly)는 파리이다. 하지만 버터플라이(Butterfly)는 나비, 드래곤플라이(Dragonfly)는 잠자리이다. 같은 플라이일지라도 품격이 다르다. 그냥 플라이는 썩은 악취에 몰린다. 따라서 플라이를 꾀는 주체는 분변일 가능성이 높다. 버터플라이는 꿀을 찾아 향기로운 꽃에 몰린다. 마찬가지로 버터플라이를 부르는 주체는 꿀단지를 품은 오뉴월의 꽃들이다.
드래곤플라이는 하루살이와 같은 원시류의 하나이다. 낱눈 수가 1만개에서 2만 8천개에 달한다. 홑눈도 정수리에 3개가 있다. 그야말로 눈치가 백 단, 아니 만 단이다. 주로 수생식물들이 자라는 곳을 선호하는데, 벌레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정된 대선이지만 그럼에도 후보 주위에 이합집산이 눈에 띈다. 대부분이 영입인사로 포장되는데 이는 서로의 필요 때문이겠다.
꽃이라면 버터플라이에게 꿀을 제공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화수분에 성공하는 거다. 분변이라면 플라이는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된다. 한편으론 악취의 대상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분해하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어디 후보의 지근거리 뿐인가. 정당에 따라 500억원을 넘나드는 선거비용이 풀리면서 이를 노리는 벌레들이 꾀고, 동시에 이들 벌레를 먹으려는 드래곤플라이도 몰려든다.
선거판이 곧 온갖 수생식물이 자라는 습지대인 셈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시대이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의 탄핵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이 아닌가. 그럼에도 책임을 어물쩍 넘기면서 대선 이후를 노린다. 계엄이 계몽이라면 파리도 새라는 주장과 같겠다.
여기저기 윙윙거리는 파리떼들이 자신을 새떼라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형국이다.결국 악취의 근원 물체를 제거해야 플라이들도 사라진다. 악취 물체를 그대로 두고 파리채 휘두르며 에프킬러만 뿌려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습지를 건강하게, 꽃밭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주권자이다. 악취를 없애는 수고로움도 주권자 몫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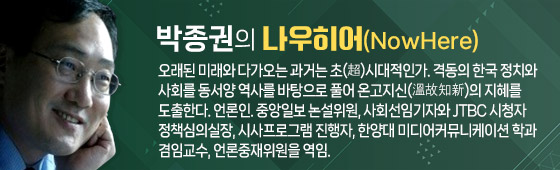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