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칼럼
- >
-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단장의 이별 치유할 남북 대화 채널 복구되길

[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강화 교동은 북한과 가까운 민통선 북단 접경 지역의 섬이다. '교동망향대'에 오르면 불과 2∽3㎞ 앞의 연백평야가 눈에 든다.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은 지척의 고향을 가슴에 담고 70여 년을 지냈다. 언젠가는 성큼 만날 것 같은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며 문마저 잠그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다고 한다. 둥지 지붕을 열어놓고 남북을 오가며 다시 귀환하는 제비를 보며 교동은 이산가족의 한을 품은 '제비마을'이 됐다.
대남 소음방송·대북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의 갈등과 대립으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말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1년 가까이 이어졌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곧이어 북한도 지난 12일 기괴한 대남 소음방송을 멈췄다. 오죽하면 피해 지역 주민은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했겠나. 강화 교동면도 그 피해 지역 중 하나다.
대북방송 중단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주의가 안보 정책에 적용된 첫 사례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외면한 채 표면적인 남북 상호 신뢰 구축은 허상이다. 결국 남북 긴장의 근원은 분단과 통일, 이산과 상봉으로 귀결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 13만 4427명 중 생존자는 26.9%인 3만 6099명으로 세월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황해도 출신이 가장 많은 7072명(19.6%)이다. 생존자 대부분이 70세 이상(84.8%)의 고령이다. 남북 분단사회가 만들어낸 이산가족 문제가 가족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걱정이다. 또 남한에 있는 탈북민 3만 4000여명도 북한에 남거나 중국 접경 지역 등에서 헤어진 가족과 살아서 만나길 바란다.
인륜으로 비유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에 관한 권리마저 지킬 수 없는 정치 체제는 인권 유린의 독재에 불과하다. 이산의 역사는 벌써 80여 년이 됐다. 이산가족 상봉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 정치적 도구에서 벗어나 인도적 접근이 우선이다. 일제 강점시대 해외 징용에 끌려간 가족은 남북 분단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생이별 신세로 생을 마쳤다. 해방 이후 월남·월북, 납북, 국군포로, 남파·북파공작원, 해외 이산 등 수많은 이산가족을 남겼다.

타인을 수용하는 다양한 가족구조가 형성되고 가족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나 어머니를 중심으로 맺어진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혈연은 버릴 수 없는 생존의 정체성으로 남아 있다. 혈연으로 연결된 이산의 고통과 상봉의 희망이 1983년 6월 KBS TV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특집 생방송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독일은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만남이 정착돼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동서 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통일을 성취한 독일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인적 교류를 실천했다.
6·25전쟁 75주년이다.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매년 수천 명에 이른다. 돌아보면 1971년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이산가족 찾기 회의는 성과가 없었다. 1985년 추석을 맞이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예술공연단과 함께 평양과 서울을 방문했다. 분단 40년 만에 열린 첫 상봉행사였다. 2000년 8월 15일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이후 2018년 8월까지 21차례가 진행됐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중에도 북한은 연평해전,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감행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과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북한의 러시아에 공병부대 파병,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 역할 등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12월 북한은 남북이 더 이상 동족·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동맹을 재인식 강화하고, 평화 공존을 부정한 북한의 무력 통일 의도를 통찰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단절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남북대화 채널이 신속히 복구되고 막혔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혈연 가족을 잃는 아픔은 단장(斷腸)의 고통에 비유된다. 6·25 전쟁 중 평남 평양시 상수구리에서 월남한 나의 아버지는 오래 전 실향의 슬픔을 안고 돌아가셨다. 북녘을 볼 수 있도록 묘지를 써달라는 마지막 유언에도 가족 이산의 아픔이 서렸다. 분명,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살아온 피붙이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무엇으로도 위로하기 힘든 단장의 이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한반도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재개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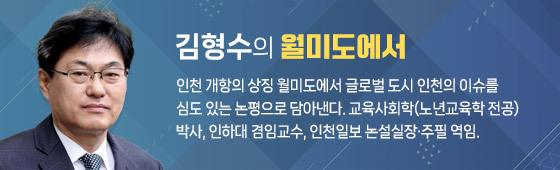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