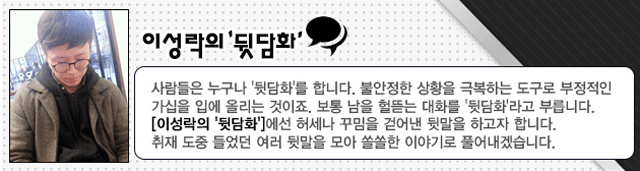|
|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분신이자 삶의 일부가 됐다. 최근 O2O 서비스 영역이 다양화되면서 모바일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대인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90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속 장면을 볼 때만 '스마트폰 없었던 때가 서로 정겨웠지'라고 생각할 뿐 금세 손가락은 바빠진다. 앞으로 의식주와 묶인 모바일 콘텐츠가 다수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도 충분히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요즘 스마트폰을 트렌디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O2O(Online to Offline)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서비스를 말한다. 예전처럼 몸을 바쁘게 움직일 필요 없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고 숙소를 예약하는 게 바로 O2O다. 관련 업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은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 전망도 밝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지난해 약 15조 원 규모였던 국내 O2O 시장이 내년엔 약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O2O 사업의 주수익 모델은 광고와 중계수수료다. 아직 초기 단계인 O2O 사업이 실속있는 성장을 보여준다면 해당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은 돈방석에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O2O 시장 규모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으로만 통했던 O2O 서비스는 신규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됐다. 가끔 중소상인의 O2O 성공 스토리가 기사를 통해 소개되기도 한다. 올 초 만난 O2O 스타트업 관계자는 "오프라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만 있다면, 무엇이든 O2O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2O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
| 카카오는 지난 5월 31일 출시한 모바일 대리운전 연결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를 시작으로 헤어숍 예약과 홈클린, 주차장 예약 등 O2O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다. /카카오 제공 |
단,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꺼낸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대기업들이 O2O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물론 거대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O2O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 기존 오프라인 사업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기업, 하청기업의 하청기업 순으로 계급화되는 '대한민국식 시장경제구조'가 O2O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형성되면 자본의 먹이사슬에 따라 '갑'과 '을'의 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지닌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한다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각종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평등한 경쟁을 벌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O2O 사업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기업은 카카오다. '카카오택시'가 시발점이 돼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했고, '카카오헤어숍', '카카오주차(가칭)', '카카오홈클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대기업 집단 분류에서 해제돼 법령의 규제를 벗어난 만큼 O2O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SK플래닛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11번가를 활용해 생활형 O2O 포털 서비스를 육성하고 있다.
O2O와 같은 신사업만큼은 양극화되지 않길 바란다. 대기업의 O2O 시장 진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겨우겨우 싹을 틔우는 그런 O2O 시장에서는 대기업의 후발진입도 다소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 마련이다. 폭리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 또한 줄어들게 된다.
O2O 시장의 길을 튼 스타트업과 후발주자인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대기업이 먼저 '상생 장치'를 마련,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열린 태도'를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