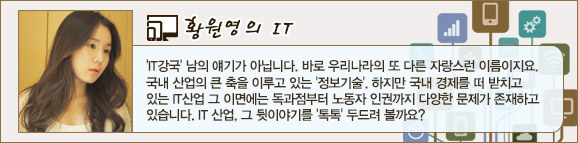|
|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동통신 3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T개발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SK브로드밴드 이인찬 대표. /SK텔레콤 제공 |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업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합병을 둘러싸고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모두가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 한계’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든, ‘자사 이익을 위한 이기적 행태’든 이번 인수합병 논란은 결국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위기를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한 계기로 작용했다.
SK텔레콤은 거액의 투자방안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했다. CJ헬로비전 합병 후 향후 5년 간 약 5조원 규모를 투자해 △디지털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 망 고도화 △쌍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에 2200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에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브로드밴드의 콘텐츠 투자액이 지난 2007년 50억 원, 2008년 205억 원, 2014년 45억 원, 2015년 65억 원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계획은 상당한 규모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등 경쟁사들은 양사 합병이 공공성과 다양성, 지역성을 훼손하고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은 공허한 펀드조성 액수만 되풀이 할 뿐 이번 투자계획이 콘텐츠 생태계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시각의 차이일 뿐 양측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방송통신 산업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아쉬운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KT는 지난해 12월 말 케이블TV 업계와 상생방안을 내놓겠다며 기대감을 안겨줬다. △중소 사업자들과 공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KT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두고 ‘자기기인(自欺欺人,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이라고 빗댔다. KT가 제시한 상생방안이 인수합병 반대를 위한 달콤한 말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자기기인인 셈이다.
 |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왼쪽부터) 등 이동통신 3사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각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팩트DB |
합병법인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유료방송업계 1위는 KT다. 1위로서 느끼는 자부심만큼 1위로서의 책임감도 크다. ‘국민기업’인 만큼 유료방송 생태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는 것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에 있어 더욱 큰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마찬가지다. △합병법인의 알뜰폰 시장 독점과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등을 이유로 이번 합병에 격렬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알뜰폰 시장을 포함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조용한 모습이다. 게다가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 사업자를 인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솔솔 흘러나온다. LG유플러스가 240만명의 IPTV 가입자(시장점유율 8.59%)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인수합병을 통한 가입자 확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SK텔레콤의 투자 계획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서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해 ‘인수합병이 이뤄졌을 경우’를 전제조건으로 깔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들었지만, 진정 방송통신 업계의 위기가 우려된다면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내놓을 수 있는 투자 계획을 마련해 놔야 한다.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통신 업계는 분명 정체기에 부딪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돌파구’라고는 할 수 없다. 규모가 큰 기업간의 사업재편은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KT나 LG유플러스의 말처럼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통신 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언론과 학계의 줄세우기가 아니라 방송통신 업계가 봉착한 위기에 대한 질문, 비판, 그리고 대안이 필요하다. 인수합병 여부를 떠나 투자가 이뤄져야 국내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먼저 ‘자기기인 ’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박과 재반박의 바탕에는 방송통신산업 발전의 실천적 청사진이 담겨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