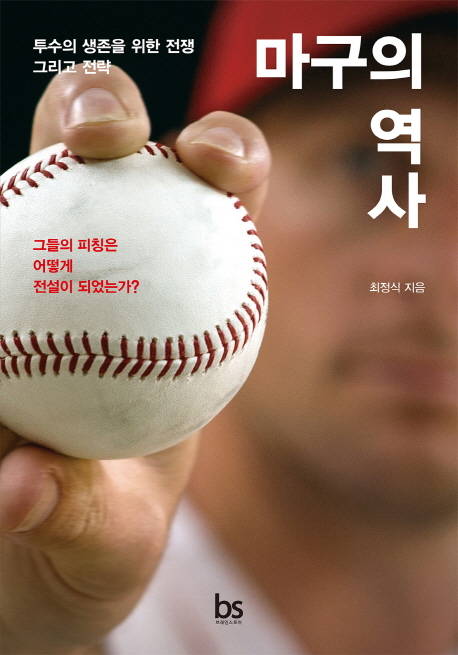|
| 스티브 칼턴 |
[더팩트 | 최정식 선임기자]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투수의 친구'다. 투수가 던지기는 쉽고, 타자가 치기는 어렵다. 투수가 던지는 어떤 공이든 컨트롤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패스트볼과 커브의 중간 형태인 슬라이더는 뛰어난 투수의 경우 패스트볼만큼 빠르게 던질 수 있으면서 커브보다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한 제구가 쉽다.
슬라이더는 거의 패스트볼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다. 꺾이는 각도는 작지만 홈플레이트에 거의 다 와서 마지막 순간에 빠르고 날카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타자의 정확한 타격을 피하기에는 충분하다. 장타를 노리는 타자에게는 헛스윙을, 그렇지 않은 타자에게도 높은 내야플라이, 파울볼, 아니면 평범한 땅볼을 이끌어낼 수 있다.
1950년대 슬라이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타자들은 곤경에 빠졌다. 커브의 일종으로 여겨졌던 슬라이더는 그 장점과 효과 때문에 곧 독자적인, 그리고 중요한 구종으로 자리잡았고 투수들이 너나할 것없이 던지기 시작했다.
1968년 메이저리그 평균 타율은 .23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슬라이더가 널리 사용된 것이 꼽힌다. 역대 최고의 타자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스탠 뮤지얼은 1941년부터 1963년까지 23년 동안 3630안타를 쳤고 통산 타율이 .331이었다. 그런 그가 "만약 슬라이더만 없었다면 나는 선수 말년에 더 많은 안타를 쳤을 것이고, 좀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슬라이더로 가장 큰 명성을 얻은 투수는 4차례나 사이 영 상을 받은 스티브 칼턴이다. 칼턴은 메이저리그 데뷔 3년째인 1967년, 14승 9패 평균자책점 2.98을 기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슬라이더를 던지기 시작한 1969년부터였다.
1968년 시즌이 끝난 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친선경기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까지 칼턴은 패스트볼과 커브만을 던졌다. 왼손 투수인 그는 오른손 타자의 몸쪽에 패스트볼을 던지는 것을 꺼렸다. 정확하게 제구가 되지 못해 약간이라도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 여지없이 얻어맞곤 했기 때문이다.
타자들은 칼턴과의 대결에서 홈플레이트 쪽에 바짝 붙어 바깥쪽 패스트볼만 기다리면 됐다. 그의 커브는 훌륭했지만 오른손 타자로서는 대응할 만했기 때문이다. 칼턴에게는 오른손 타자들을 홈플레이트에서 바깥으로 밀어낼 제3의 구종이 필요했다.
그는 일본 타자들을 상대로 슬라이더를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일본 방문 첫 경기에서 홈런왕 오 사다하루(왕정치)에게 몸쪽 패스트볼을 던지다 홈런을 허용했다. 그러나 다음 번 대결에서는 슬라이더를 던져 삼진을 잡아냈다. 왼손 강타자인 오와의 대결을 통해 그는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자신감을 갖게 됐고 이 공이 왼손 타자에게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다. 칼턴이 친선경기에 출전한 도쿄 오리온즈 투수 나리타 후미오의 슬라이더에 매료됐다는 것이다. 나리타는 구속이 패스트볼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빠른데다 커브보다는 작지만 다른 투수들의 슬라이더보다는 크게 변화하는 슬라이더를 앞세워 그해 20승을 올렸던 터였다. 스피드와 변화 모두 위력적인 칼턴의 슬라이더가 일본에서 배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칼턴이 나리타의 투구에 감명을 받아 슬라이더를 던져야 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편화된 상태였다. 그가 처음부터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았던 것은 스크루볼이 그랬던 것처럼 슬라이더도 부상을 부르는 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칼턴은 1969년 2월 스프링캠프에서 투수 코치 빌리 머펫에게 슬라이더를 새 구종으로 추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머펫은 슬라이더가 패스트볼이나 커브보다 팔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며 말렸다.
그러나 칼턴이 시즌 초반 6경기에서 4패를 기록하자 머펫은 슬라이더를 던지는 데 찬성했다. 팔에 통증이 없고, 커브 컨트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칼턴은 전체 투구 가운데 25% 정도의 비율로 슬라이더를 던졌고, 타자들은 패스트볼과 커브 외에 슬라이더가 들어올 것까지 신경써야 했다. 바깥쪽 패스트볼만 노려서 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슬라이더를 던진 첫해에 칼턴은 17승 11패의 좋은 성적을 거뒀다. 평균자책점은 전 시즌에 비해 0.82나 낮아진 반면 탈삼진은 48개가 늘어났다.
그러나 점점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릴리스 동작이 나빠졌다. 팔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1970년 시즌이 끝나기 전에 그는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게 됐다. 그 시즌 그의 성적은 10승 19패로 곤두박질했고 평균자책점은 3.72로 치솟았다.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팀을 옮긴 뒤 첫해인 1972년, 칼턴은 다시 슬라이더를 던지는 모험을 했고 팀 전체 승수의 절반에 가까운 27승을 올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1973년 그의 성적은 13승 20패로 다시 나빠졌다. 슬라이더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 시즌 이후 그는 슬라이더를 안정적으로 제구할 수 있었다. 그는 1988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통산 329승 4136탈삼진으로 각각 왼손 투수 역대 2위의 기록을 남겼다(1위는 워렌 스판과 랜디 존슨이다).
칼턴의 슬라이더는 압도적이었다. 그의 단짝이었던 포수 팀 매카버는 "공을 꽉 잡으면 잡을수록 공에 회전이 많이 걸린다. 그는 팔뚝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다른 투수들보다 훨씬 강하게 공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그의 슬라이더는 때때로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바운드가 될 정도로 크게 떨어졌지만 타자나 심판은 마치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곤 했다"고 말했다.
사실 칼턴의 팔 힘이 그렇게 강해진 것은 패스트볼 때문이었다. 스카우트들로부터 메이저리거가 되기에는 패스트볼의 스피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당시로서는 야구선수, 특히 투수에게는 금기였던 웨이트트레이닝에 몰두했다. 왼손을 쌀이 담긴 통에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단련했고, 쇠공을 이용해 악력을 키우기도 했다. 빠른 패스트볼을 던지기 위한 노력들이 최고의 슬라이더를 만드는 바탕이 됐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1982년 칼턴과 함께 월터 존슨의 탈삼진 기록(3509)을 넘어섰던 놀런 라이언 역시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 강한 몸을 만들려고 노력한 투수였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