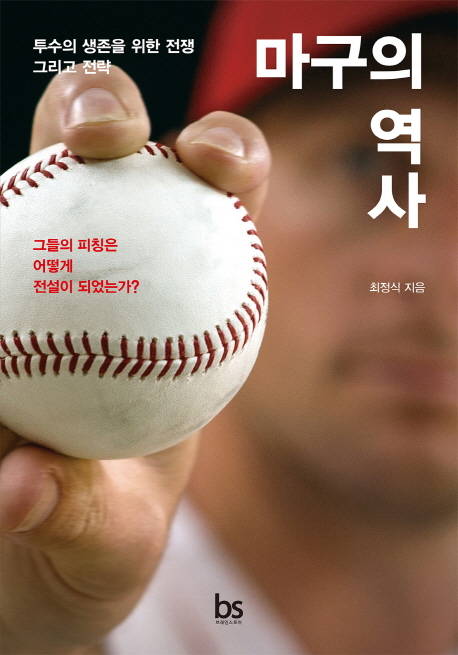
[더팩트 | 최정식 선임기자]
라디오볼의 전설
패스트볼(fastball)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직구(直球)라고 불러 왔다. 일본에서는 '스트레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변화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 것이다. 브레이킹볼(breaking ball)은 '상대적으로' 똑바르게 가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궤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든 투구를 의미한다.
패스트볼이라고 해도 곧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조금씩은 휘며 아래로 처지기도 한다. 패스트볼이라고 다 빠르지도 않다. 최근에는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의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패스트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속구(速球)'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패스트볼은 '구종의 제왕(king of pitches)'이라고 부를 만큼 가장 기본적인 공이며 당연히 스피드가 중요하다. 히트(heat), 가스(gas), 스모크(smoke) 등 패스트볼의 별칭들이 대부분 스피드와 관련이 있다. 많은 별칭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라디오볼(radio ball)이다. 타자가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오버핸드로 던지는 것이 허용된 순간부터 모든 투수들의 꿈은 타자가 칠 수 없는 빠른 공을 갖는 것이 되었고, 그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
19세기에 267승, 20세기에 244승을 거둬 역대 통산 최다인 511승의 업적을 남긴 사이 영의 원래 이름은 덴턴 트루 영이었다. 그가 '사이(Cy)'라는 별명을 얻게된 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오하이오의 마이너리그 팀 캔턴에서 영의 공을 받아주던 포수가 "공이 사이클론처럼 빠르다"고 말했는데 기자들이 '사이'라고 줄여서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는 원래 시골뜨기에게 흔히 붙이던 별명이었다는 설도 있다.
영은 오하이오의 한 농장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이클론 이야기는 한발 더 나아가 그가 던진 공을 타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회오리바람이 부는 듯한 굉음만을 들었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포수 치프 짐머가 영의 빠른 공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미트에 고깃덩어리를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꼭 영 때문만은 아니었다. 짐머의 포수 생활 가운데 처음 8년은 투수와의 거리가 50피트로 가까웠다. 영 외에도 많은 투수들이 그 거리에서 빠른 공을 던졌다. 영이 명성을 얻은 이후 엄청나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나오면 사이클론 피처라고 불렀다.
빠른 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투수가 앞에 나왔던 에이모스 루시다. 1893년 투포수 간의 거리가 50피트에서 60피트6인치로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루시의 별명은 '인디애나 대포알(The Hoosier Cannonball)'이었다.
시카고의 외야수였던 지미 라이언은 "그가 던진 공의 빠르기는 말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마치 하얀 선 하나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50년 동안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 감독으로 있으면서 1890년대 이후 투수들을 대부분 봤던 코니 맥은 루시의 공이 가장 빨랐다고 단언했다. 오랫 동안 뉴욕 자이언츠의 감독을 지낸 존 맥그로도 그에 동의했다.
'라디오볼'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투수가 월터 존슨이다. 메이저리그 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 꼽히는 그의 패스트볼이 얼마나 빨랐는지에 대한 증언은 수없이 많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외야수였던 프랭크 보디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칠 수는 없다"고 했고, 뉴욕 양키스의 버리 크리는 "그의 팔이 앞으로 나오는 순간 배트를 휘둘러야 맞힐 수 있다"고 했다. 1900년대 초반 장타자로 이름을 날린 샘 크로포드는 "당시 쓰던 피칭머신에서 튀어나오는 공이 꼭 총알 같았다. 쉬익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지나가면 공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존슨이 던지는 공이 바로 그랬다"고 회고했다.
"투 스트라이크가 된 순간 그 때부터 스윙을 시작하면 다음번 공을 맞힐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클리블랜드의 유격수 레이 채프먼은 존슨에게 투 스트라이크를 먹고 나자 아예 삼진을 각오하고 타석을 벗어나 버렸다.
사실 존슨의 공이 타자들이 느낀 것만큼 빠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기 때문에 금세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포물선을 그리는 느린 공을 던지듯이 부드러운 사이드암 동작으로 쉽게 투구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보였을 것이다. 존슨은 자신의 공에 타자가 맞아 죽지나 않을까 항상 걱정했다고 한다.
'사이' 영이나 '빅 트레인(Big Train)' 존슨처럼 조 우드도 빠른 공 때문에 '스모키(Smokey)'라는 별명을 얻었다. 1912년 존슨은 우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그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는지 되묻고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스모키 조 우드보다 더 빠른 공을 던지는 이는 없다"고 말했다.
1939년 기계장치를 사용해 데드볼 시대 투수들이 던진 공을 직접 봤던 이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실험이 있었다. 그 결과 존슨이 초당 134피트(시속 147㎞)로 가장 빨랐고, 크리스티 매튜슨이 127피트(139㎞), 우드가 124피트(136㎞)로 나왔다. 실험 참가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확성에 의문이 남지만 명성에 비해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존슨이 1914년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측정했을 때는 구속이 99.7마일(160.4㎞)이었다. 어느 쪽이 실제에 가까운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역시 전설은 전설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1930~1940년대 니그로리그의 슈퍼스타였던 새철 페이지도 총알 같은 강속구를 던졌다. 미디어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니그로리그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의 활약도 '신화'의 차원으로 남아 있다. 노히트노런 55회, 탈삼진 3만 개 이상 등 믿기 어려운 기록을 니그로리그에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패스트볼 스피드 역시 전설에 가깝다. 흑인 선수들은 인종의 장벽 때문에 1947년 이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었지만 니그로리그 팀과 메이저리그 팀 간의 순회 경기는 종종 열렸다.
메이저리그의 스타 투수였던 디지 딘은 페이지와 연장까지 가는 투수전을 펼친 끝에 0-1로 패했다. 딘은 "페이지가 던진 공에 비한다면 내 패스트볼은 체인지업 수준"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56경기 연속안타의 위대한 기록을 세운 강타자 조 디마지오도 "내가 본 투수 가운데 최고이고 공도 가장 빠르다"고 평가했다.
1930년 내셔널리그 홈런왕과 타점왕을 차지한 핵 윌슨은 페이지에게 "처음에는 공처럼 보이던 것이 홈플레이트로 다가오자 구슬처럼 보였다"며 감탄했다. 그러자 페이지는 "내 슬로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패스트볼이었다면 물고기 알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지는 1948년 마흔 살이 넘은 나이에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입단했는데 팀 동료였던 밥 펠러의 공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가 펠러보다 빠른 공을 던졌다면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36년 17세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7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됐던 펠러는 당대 최고의 강속구 투수였다. 그는 초기에는 컨트롤이 형편없었는데 타자들은 그 빠른 공이 언제 자신을 향해 날아들지 몰라 두려움에 떨었다.
펠러와 존슨의 공을 모두 본 이들은 대부분 펠러가 더 빠르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육군은 움직이는 물체의 스피드를 측정하는 장치를 이용해 펠러의 구속을 쟀는데 98.6마일(158.7㎞)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펠러는 4년 가까운 군 생활을 마치고 막 전역했을 때였다. 전성기의 구속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펠러로부터 약 1.8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되었는데 공을 뿌리는 순간의 속도를 측정했다면 약 172㎞에 달했을 것이다.
펠러는 1946년 그리피스 스타디움에서 측정했을 때 107.9마일(173.6㎞)이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은퇴 후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면서 "지금 투수들이 던지는 공은 내 체인지업처럼 보인다"며 웃곤 했다.
malishi@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