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쓴 이어령 선생은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통찰력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너도나도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를 부르짖을 때 그는 '디지로그(Digilog: Digital+Analog)'를 제시했다. 0과 1로 표현되는 분절(分節)의 디지털이지만, 종당의 꿈은 끊임없는 영속(永續)의 아날로그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보지(保持)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 없는 0과 1의 매트릭스에 갇혀 허우적거리지 않겠느냐는 통찰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어령 선생의 '디지로그'가 "서양의 방법론과 동양의 방법론이 융합하는 시대"라는 선언으로 들린다. 그는 과거 강의에서 서양의 방법론을 트렁크에, 동양의 방법론을 보따리에 비유했었다. 트렁크를 열면 칸막이와 주머니가 촘촘하게 나뉘어 있다. 셔츠 따로, 서류 따로, 세면도구 따로다. 반면 보따리를 펼치면 셔츠와 서류와 세면도구가 함께 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직관주의를 트렁크와 보따리로 표현한 것이다. 현대적으로 보자면 트렁크는 디지털, 보따리는 아날로그가 원관념이다. 그는 당시 서양의 합리주의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던 듯하다. 하지만 '디지로그'를 강조하는 시점에서는 '직관의 효용'도 인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는 말하자면 '생각의 집'에서 뭔가를 찾을 때 상중하로 나뉜 디렉토리(Directory) 방식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모두가 한데 모여있는 상황에서 일직선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차이이다. 기업의 경영을 예로 들면 '조사 경영'과 '직관 경영'의 차이쯤이다. '조사 경영'이 시장조사와 SWOT 분석에 이어 4P전략으로 접근하는 근대적인 기업경영 방식이라면, '직관 경영'은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처럼 자신의 '느낌'을 믿고 밀고 나가는 방식이다.
그러면 '조사 경영'이 항상 성공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반대로 '직관 경영'이라고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도 아닌 것 같다. 굳이 성패의 비율과 승부 가능성을 보자면 아마도 반반, 50대50이 아닐까. 직관도 따지고 보면 수많은 경험 사례를 통해 비록 순간적이지만 모든 것을 융합한 가운데 이뤄지는 판단이다. '느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저 피동적인 느낌이 아니라 축적에서 발원한 능동적 혜안(慧眼)이다. 침팬지나 어린아이가 심지 뽑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느낌'은 어떻게 숙성될까. 다시금 이어령 선생의 비유를 보자. 이름하여 '자본주의 바다의 삼치(세 물고기)'이다. 첫째는 넙치다. 바닥에 바짝 엎드려 물결 치는 대로 너울너울 살아간다. 둘째는 참치다. 참치는 쉬지 않고 헤엄친다.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쏜살같이 달린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물에라도 걸리면 순간적으로 질식 상태에 빠진다(이어령 선생의 주장인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다). 셋째는 날치다. 날치는 간혹 바다 위를 날아오르는데, 이때야 비로소 바다를 본다는 것이다.

여기서 넙치, 참치, 날치는 '자본주의 바다'에서 살아가는 세 유형을 비유한 것이다. 넙치는 현상에 순응해 살아가는 대부분의 서민들이고, 참치는 목표지향형 성공지상주의자이다. 넙치와 참치는 바다 속에 살지만 정작 바다를 모른다. 다만 날치가 종종 바다 위를 날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바다의 진면모를 본다. 헌데, 날치가 바다 위를 나는 것은 '아가리(Jaws)'에 쫓길 때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위태위태한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가 처한 '바다'를 본다는 것이다. 아널드 토인비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는 말과도 맥이 통한다. 한계 상황에 부닥치지 않고서는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합리냐, 경험이냐. 서베이(Survey)냐 직관이냐. 참치냐, 날치냐. 이는 비단 경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화제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대선후보 선호도 1위까지 올랐다고 한다. 여론이야 오뉴월에 죽 끓듯 하지만, 까마귀가 불에 타 죽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데, 이 또한 시사점을 볼 필요가 있다.
유승민은 그 동안 '민주주의 바다'에서 한 마리의 참치였을지 모른다. 그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다 '아가리'에 쫓기면서 살아남기 위해 물 밖으로 튀어 올랐고, 순간 바다의 진면모를 봤을 것이다. 그가 퇴임의 변에서 헌법 가치를 운위하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직이 힘주어 말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 정치의 바다에서 '날치'가 된 것이다.
본디 정치권력은 목표가 될 수 없다. 권력은 수단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국태민안(國泰民安) 아니겠는가. 맹자는 "임금보다 사직(社稷)이다"고 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각하보다 국민"이다. 그러면 '날치' 유승민은 앞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바다'를 헤엄칠까.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인용해 비유하자면, 그는 아직 '몸짓'에 불과하다. "국민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국민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과연 그는 '꽃'이 될 수 있을까.

온공(溫公)은 말한다. "예(禮)로써 정치를 세우고, 인(仁)으로 인민을 품는 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를 건드리는 자는 부서지고, 범하는 자는 타버릴 것이다"라고 했다. 아마도 그를 건드리고 범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를 타개(打開)하는 방법은 무슨 권모술수나 합종연횡이 아니라 예(禮)와 인(仁)이란 조언이다.
비록 '꽃'이 아니면 '대장부(大丈夫)'는 어떠한가. 맹자에 따르면 "뜻을 펴게 되면 백성에게 혜택을 끼치고, 설령 뜻을 펴게 되지 못하면 홀로 도를 행하면서 부귀에 아첨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도 지조를 바꾸지 않으며, 위협적인 무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대장부라 했다. "삼군의 장수는 꺾을 수 있지만, 필부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고 했다. 하물며 대장부랴.
중국에서 장부(丈夫)는 남편을 뜻한다. 가정의 가장인 것이다. 가정(家庭)으로 쓰지만, 가정(家政)으로도 쓴다. 여자고교 교과서의 '가정'은 가정(家政)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인데, 집안의 정치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로 미루어 대장부(大丈夫)는 국가의 가장쯤일까.
송사리 한 마리가 물을 거스른다고 해서 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의 물줄기는 작은 '몸짓'에도 반응한다. 그것이 물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산을 만나면 돌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로 떨어지는 것이다. 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것은 또한 이곳 저곳 여기저기 골고루 적시기 위함이다. '큰 강은 동쪽으로 흐른다(大江東去)'지만 '아버지 강'이자 '정치의 강'인 황하(黃河)는 동으로, 북으로, 남으로, 서로, 그리고 다시 동으로 흐른다.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정치는 동서남북을 향해 가지만 항상 해가 뜨는 곳, 즉 희망을 향해 흐른다는 것이 첫째이다. 둘째는 동서의 골과 남북의 분단까지도 아우르며 흐르는 것이다. 얼음이 풀린 봄의 강물은 '사택(四澤)'을 가득 채우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하운다기봉(夏雲多奇峰)이다. 어느 구름에서 비를 뿌릴 것인가. 그런데 이 구름들이 비의 씨앗을 품기는 했을까. 그저 뭉게구름으로 피어 올랐다가 흩어지는, 그저 손바닥 뒤집어 만드는 구름(飜手作雲)은 아닐까. 그가 한 소리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一鳴驚人), 한번 날아 하늘을 찌를지(一飛沖天)는 지켜봐야 알 터이다. "추위가 닥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세한연후 송백이후조)"고 하지만, 아직 여름이다.
[더팩트ㅣ박종권 편집위원 sseoul@tf.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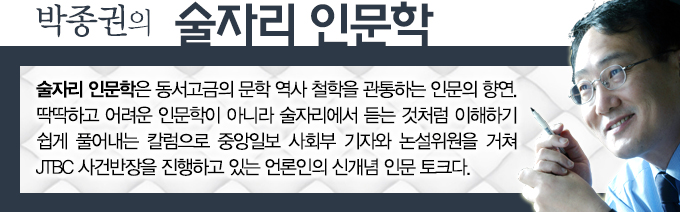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