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칼럼
- >
- 박호재의 왜들그러시죠

김두관 외침 주목...“빨갱이 소리 들으며 김대중 벽보 지켰다…그런데 내가 꼴찌다”[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김두관 후보는 가슴 속에 숨겨두고 있던 통한을 털어놓았다. 토론회 말미에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는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사회자의 주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나갔다 하면 당선이 보장되는 곳에서 꽃길만 걸어온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빡빡 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경남 남해 제 고향에서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지켰습니다. 험지 영남에서 노무현정부 출범을 위해 온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꼴찌입니다. 이보다 더 야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남 동지들은 제 마음과 똑 같을 것입니다."
이날 김 후보의 절절한 토로에 공감한 지역민들이 적지 않았다. 그냥 말 뿐이 아니라 김 후보가 걸어온 정치의 길이 그 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의 정치인들은 걸핏하면 DJ를 자신의 정치에 덧대고 앞세운다. DJ의 후계자니, DJ의 적자니 등등의 말을 입에 올리며 DJ의 정치철학을 구현하는 정치인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그들의 이런 말들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지역민은 별로 없다.
아니 오히려 냉소적이다. 'DJ의 100분의 1만 해도 상주겠다.'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저승에서 헛웃음 치겠다.' 이런 비아냥거림으로 화답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수의 민주화세력을 이끌고 군부독재와 당당히 맞서며 불굴의 의지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DJ의 위업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 때문일 것이다.
지역주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지만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 된 배경에는 바로 이 같은 DJ 정치에 대한 호남인의 오랜 신뢰가 잠재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포스트 DJ' 라는 지역민의 인물론이 정치의 매 중요한 국면마다 대두되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정치인이 아직은 없다는 게 지역민들의 중평이다. 이 때문에 DJ가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는 정가의 비난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이제 고인이 됐으니 이조차 후일담에 불과하다.
고인의 위업을 잇는 일은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DJ정치를 운운하는 호남의 정치인들이 포스트 DJ가 되기 위해 과연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솔직히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저평가의 배경에는 김두관 후보의 언급에서 드러났듯이 꽃길만을 찾아다닌 정치행로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DJ의 정치철학을 무수히 거론하지만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험로를 마다하지 않은 DJ의 신념이 그들의 심장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DJ와 같은 호남 출신이고, DJ를 모시고 정치를 해왔다는 이력만 새겨져있을 뿐이다.
DJ의 그늘에서 자란 호남 정치인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DJ의 낙점만 받고 나면 한결같이 당선이 손쉬운 호남이라는 옥토로 낙향했다. 빅 리그에서 고군분투하며 대 선수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일찌감치 팽개쳐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니 포스트 DJ라 일컬을 만한 큰 정치인인 될 리가 만무하다. 국면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호남에서 다선이 무슨 계급장이냐’고 묻는 다그침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 나섰을 때 호남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데는, 그가 DJ를 배척하는 불모지 영남에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을 얻었을 정도로 지역을 넘어선 명분의 정치를 위해 안간 힘을 썼기 때문이다. 실인 즉 그가 DJ 정신을 이어가는 후계자로 호남인이 인정했던 셈이다.
김두관 후보가 통렬하게 비탄한 ‘꽃길의 정치’를 대의를 위해 거부할 수 있는 정치인이야 말로 호남이 인정하는 '포스트 DJ‘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비로소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껴안을 수 있는 자만이 'DJ 후계자'를 자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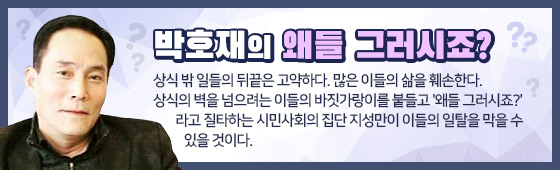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